영광군민들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영광 미래 리더스 아카데미가 영광신문 지면을 통해 찾아왔다. <편집자 주>
제6강 리더와 함께 하는 논어 이야기 下
인생의 고난기 세한(歲寒)

공자의 고난기 세한시대는 춘추 전국시대이다. 공자는 작은 노나라 출신이다. 노나라는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침범을 받은 나라이다. 공자는 태어날 때 아버지는 70세, 어머니는 16세였다. 공자의 출생은 정상적인 출생이 아니라고 알려졌으며, 누나가 여러명이고 형이 한명 있었다. 형은 불구였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싶어서 젊은 엄마에게 공자를 보았다.
공자는 18세 결혼하고, 창고지기, 축사지기라는 직업을 거치며 20대 초반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삶이라고 했다. 나는 어려서 매우 천했다고 공자도 인정했다. 그런 공자가 어떻게 현인의 반열에 올랐을까?
50세 정도가 작은 읍을 다스리고 대사부 (법무부 장관)에 오르고 정승에 올라 55세에 쫓겨나며 14년동안 7개 나라를 다니면서 군주들에게 자신의 정치사상을 설파했다. 당시 제왕들은 공자를 환영했는데, 군주들은 자신의 나라가 패권을 잡기 위해 물어볼 것을 준비했으나, 공자의 말은 인의 정치, 사람을 사랑하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점점 공자를 거부하기 시작했으며, 70세에 마지막 책을 쓰고 73세에 죽는다.
그 일생에서 한겨울 제자들과 겨울 산에서 고생하던 시절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 한겨울이 된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저 소나무와 잣나무가 한겨울에도 독야청청 푸르른 잎을 유지하며 견디는 것처럼 군자는 차디찬 겨울에도 버틸 수 있어야 한다.
세한도라는 그림의 세한은 논어에서 따온 말인데, 논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설명 없이도 내용을 할 수 있다. 추사 선생은 나이 50에 제주로 유배를 가는데, 풍토병, 음식도 안 맞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 자신이 한양에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굽신거렸는데, 제주에는 아무도 날 찾지 않아 외로움이 자신을 괴롭혔다. 추사의 제자인 이상벽이 계속 제주도로 찾아와 청나라에서 온 책을 제공했는데, 이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추사 김정희가 그 제자에게 보낸 그림이 바로 세한도이다.
이 내용은 나에게 보내준 중국에서 온 책을 한양의 다른 높은 사람에게 보내주면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될 텐데 제주에 온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렇게 보내주니 고맙다. 당신은 한양에 있던 나에게 대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나를 대하고 있으니 고맙다. 공자가 겨울산의 청청한 나무를 보며 당신을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이 세한도를 청나라 문인들이 감상문을 써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제주에서 세한도 진품 전시회를 하는데, 그 감상문이 함께 공개되었다.
2500년전 공자가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힘든 시기에도 여전히 푸르른 나무를 칭송했던 것처럼, 200년전 추사 김정희도 같은 이야기였다. 안중군 의사가 쓴 한겨울이 되어도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지지 않는다고 쓴 서체를 보면, 안중근 의사가 고통스러워하던 그시절 2500년전의 공자의 가르침이 여전히 안중근의 심중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글은 처형당하던 그 달에 쓴 글이다. 일제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나라를 유린하고, 나를 굴복시키려 하나, 나는 여전히 소나무와 전나무처럼 국가에 대한 충정이 푸르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송백은 조직을 살리는 대표 브랜드이며 개인을 살리는 퍼스널 브랜드이다.
현대인들에게 송백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2~30년간 한가지 일을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전문가가 되기 쉽지 않다. 올해 받은 연봉을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면 여전히 이 사람은 브랜드가 있는 것이다.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면 퍼스널 브랜드가 충분한 것이다. 봄여름가을겨울처럼 뭔가 조금 없지만, 뭔가 부족할 때 같이 모여 공부하며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면, 삶이 어려워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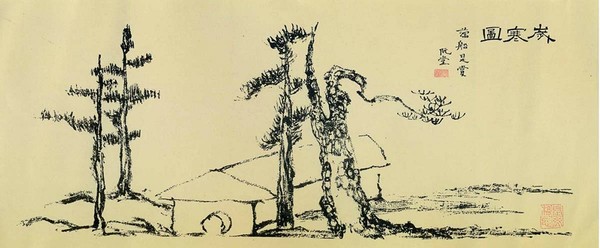
일생동안 잊지 말아야 할 한마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과 달라)
‘내 생각이 맞다’와 ‘내 생각만 맞다’와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己所不欲 勿施於人(기소불욕 물시어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라.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남이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이기심이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 상대에게 관용을 베푸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다.
출전은 《논어》 「위령공」편
己;몸 기 所;바 소 不;아니 불 欲;바랄 욕 勿;말 물 施;베풀 시 於;어조사어 人;사람 인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평생을 지켜나갈 만한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공자가 답했다. 「그것은 관용(恕)이니,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己所不欲勿施於人)이다.」
‘서(恕)’는 자기의 입장과 남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 서(恕)의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은 자기중심성을 탈피할 수 있다. 내가 원치 않는 바라면 남에게도 하지 마라! 우리에게 미치는 말이 왜 2500년전이나 지금이나 유사할까?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양은 같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 때문에 의가 갈리고 사는 형제지간들이 많다. 하지만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어도 1년에 1번이라도 용서가 된다면, 서운한 마음에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은가?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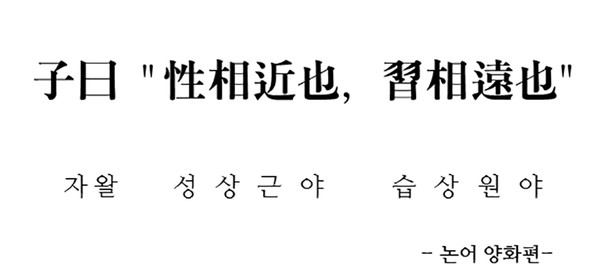
세상에 성공과 실패가 있다면 이것 때문일 것이다. 습관이 우리를 멀게 만든다. 조화와 균형의 저울추, 내 안의 본성으로부터 일상의 편리를 위해 우리는 익숙한 대로 길들여진 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직시하지 않는다. 습관은 우리가 일상적 편리를 위해 자기의 중심점을 맞바꾼 결과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내 안의 본성은 가려져 잊혀진 것일 뿐 사라져 없어진 것은 아니다.
본성(本性)으로 전환의 여지는 상존한다. 즉, 자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 숨은 내 안의 빛과 대면할 수 있다. 가장 본성이 비슷한 사람은 형제자매들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과 동생의 형편이 다르다면 무엇 때문일까?
그게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형이 반복한 것과 동생이 반복한 것이 그들의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이며, 멀어지게 된 것이다.
조건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쌓여서 현재의 자신이 된 것이라고 한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준하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 연습, 복습, 학습 습이 삶을 바꾸는 것이다.
처음 천자문을 접하고, 그러니 논어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논어를 통해 직장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50대에 처음 논어책을 내고, 한국 강사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연습 복습 학습을 통해 인생 전반전은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인생 후반전은 습습습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갔다. 여러분들에게도 과거의 삶의 변화시켜 기회를 찾아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한다.
/국형진 시민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 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